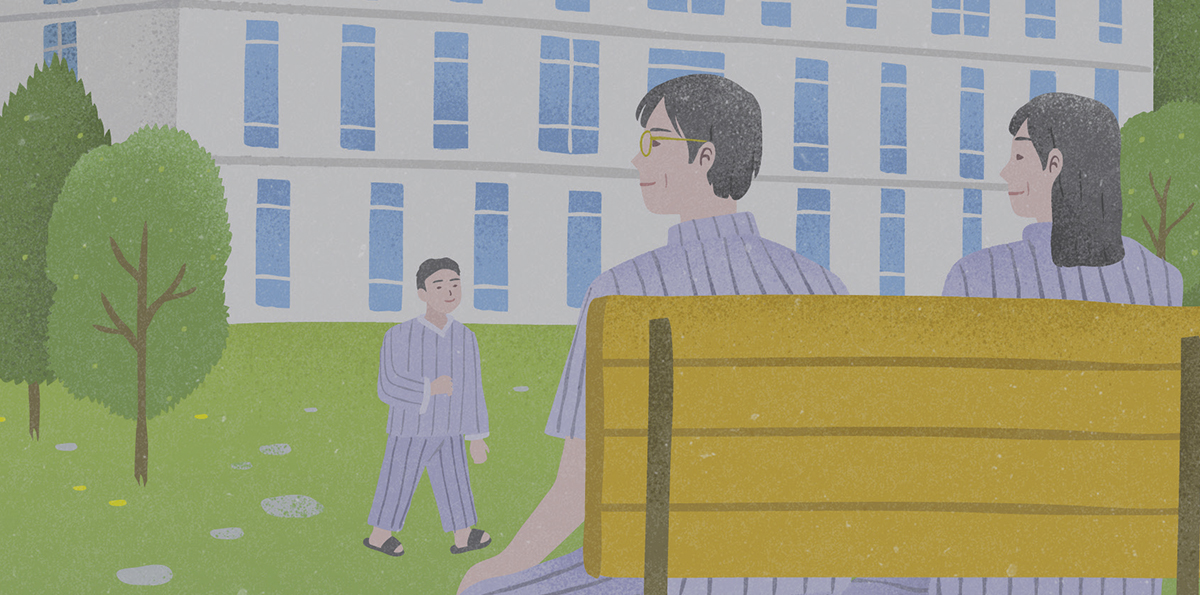
- “젊고 건강해 보이게
한 장 부탁합니다” - 정선병원 환자 이야기
나는 높다란 산 아래, 맑은 강물이 졸졸 흐르는 시골 병원에 살고 있습니다. 경치 좋고 공기도 맑은 이곳에는
나처럼 숨 쉬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모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의사 선생님께 치료도 받고, 재활운동도 하고,
텃밭도 가꾸면서 말입니다. 가족들과 자주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남은 생을 병원에서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동에 안내문 한 장이 붙었습니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사회복지사가 왔으니 언제든 상담하러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병원 생활만 몇 년인데, 새로 온 사람이 뭘 안다고 그려?”
“치료받고 운동하기도 힘든데 상담은 무슨.”
“지나가면서 보니까 상담하러 가는 환자도 없더구먼.”
10년 넘게 병원에서 지낸 나는 다른 환자들처럼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나보다 한참 어린이방인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선뜻 믿음이 가지 않았거든요.
“아니, 우리가 병원 생활만 몇 년인데, 새로 온 사람이 뭘 안다고 그려?”
“치료받고 운동하기도 힘든데 상담은 무슨.”
“지나가면서 보니까 상담하러 가는 환자도 없더구먼.”
10년 넘게 병원에서 지낸 나는 다른 환자들처럼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나보다 한참 어린이방인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선뜻 믿음이 가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몇몇 환자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상담 받았다며? 절대 안 간다고 하더니.”
“물리치료 해준다기에 갔다가 잠깐 얘기 나눈 거지 뭐. 그 양반 여기 오기 전에는 물리치료사였다는데?”
그 말에 관심 갖는 이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소식 들었어? 옆방 아무개 씨 말이야. 영정 사진이 없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10년 넘게 병원에만 있던 양반이니, 쓸 만한 사진도 별로 없는 모양이야.”
“장례 치르는 것도 정신없을 텐데, 가족들이 고생이네 그려.”
그 소식에 마음이 쓰여 장례식장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고를 듣고 달려온 유가족은 슬프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병원에 새로운 안내문이 한 장 붙었습니다. 장수사진관이 문을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회복지사 선생이 병동까지 찾아와서는 나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자네, 상담 받았다며? 절대 안 간다고 하더니.”
“물리치료 해준다기에 갔다가 잠깐 얘기 나눈 거지 뭐. 그 양반 여기 오기 전에는 물리치료사였다는데?”
그 말에 관심 갖는 이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소식 들었어? 옆방 아무개 씨 말이야. 영정 사진이 없다던데?”
“그러게 말이야. 10년 넘게 병원에만 있던 양반이니, 쓸 만한 사진도 별로 없는 모양이야.”
“장례 치르는 것도 정신없을 텐데, 가족들이 고생이네 그려.”
그 소식에 마음이 쓰여 장례식장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고를 듣고 달려온 유가족은 슬프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병원에 새로운 안내문이 한 장 붙었습니다. 장수사진관이 문을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사회복지사 선생이 병동까지 찾아와서는 나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랑 장수기원사진 찍으러 같이 가세요. 사진을 미리 준비해두면 더 오래 산대요.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찍어둬야 가족들도 좋아하지요.”
나는 잡힌 팔을 슬쩍 빼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좋아 장수기원사진이지 영정 사진이라는 걸 모를 리 없으니까요. 장수사진관은 그 후로도 매년 문을 열었지만, 나는 안내문이 붙을 때마다 사회복지사 선생을 피해 다녔습니다. 같은 방 이 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전까진 말이죠. 그날 이 씨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젊고 건강해 보였던 그의 얼굴과 마주했거든요. 그 시절을 그리며, 먹먹한 마음을 안고서, 나는 오늘 장수사진관을 찾아갑니다.
생전 처음 넥타이를 매고서 말이지요.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찍어둬야 가족들도 좋아하지요.”
나는 잡힌 팔을 슬쩍 빼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좋아 장수기원사진이지 영정 사진이라는 걸 모를 리 없으니까요. 장수사진관은 그 후로도 매년 문을 열었지만, 나는 안내문이 붙을 때마다 사회복지사 선생을 피해 다녔습니다. 같은 방 이 씨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전까진 말이죠. 그날 이 씨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젊고 건강해 보였던 그의 얼굴과 마주했거든요. 그 시절을 그리며, 먹먹한 마음을 안고서, 나는 오늘 장수사진관을 찾아갑니다.
생전 처음 넥타이를 매고서 말이지요.
편집자 주. ‘고마운 당신’에 실린 이야기는 공단 병원을 이용한 고객의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