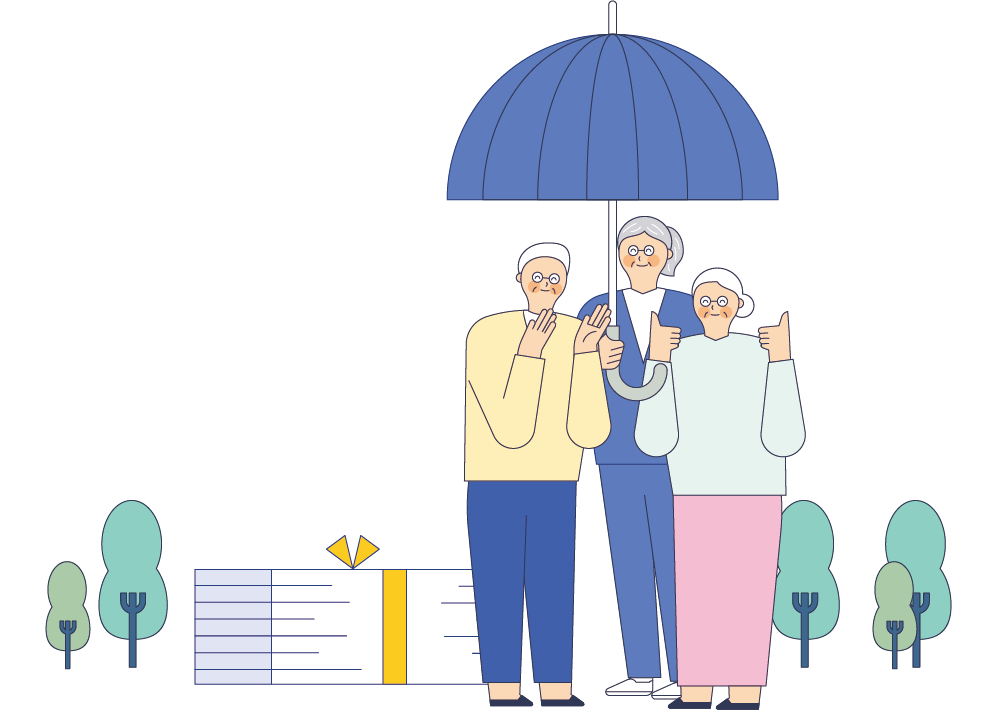
연간 수령액 기준을 기억하세요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령에 따라 3.3%~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16.5%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해야 하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2000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 추가 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 원 여부 판단 시 제외됩니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은 늦을수록 좋아요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세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 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5만 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 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는데,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5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55세가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IRP는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해요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적절한 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형 IRP는 연금 지급 개시 이후의 자산 운용 방법 및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계약 형태가 달라집니다.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유연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탁계약이 적합합니다. 반면, 생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종신 연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이 좋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IRP 가입 시에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구조와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과 연금 수령 선호 방식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확인서 챙겨두세요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가입자는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납입 시 세제 혜택을 받지 않게
되며,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향후 연금 수령이나 자금 인출 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를 나누어 보유한 경우, 개별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납입금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어, 별도 증빙이 없을 경우 연금 지급액 전액을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가입자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준비해 연금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전 또는 연금 개시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