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읽고 그리는 삽화가이자 생활하며 쓰는 에세이스트. 일상의 만화 같은
순간을 모아 종이 위에 표현한다. 책의 세상에서 쓰고 그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독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은
책으로는 〈빵 고르듯 살고 싶다〉, 〈아직, 도쿄〉, 〈읽는 생활〉 등이 있다
‘다음’이 있다는 말의 의미
재미있는 질문을 받았다. “작업실에 가면 뭐해요?” 작업실이 있고 평일에는 매일 출퇴근을 한다고 말했더니 받았던 질문이었다. 프리랜서에게 작업실의 존재는 당연시되진 않지만, 오히려 집에서 작업을 한다는 걸 대단하게 여겨왔던 나에게는 다소 색다른 질문이었다. 머리를 긁적이면서 대답했다. “일을 하죠”.
전혀 다른 풍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일이 많으면 안 불안해요?” 프리랜서라면 일이 없을 때 불안할 테지만, 나는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일이 없을 때를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일을 잘 마무리하고 마감을 해내야 하고 마감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들이 현실적인 불안으로 다가온다.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다음이 있다는 게 저에겐 필요해서요”.
내가 하는 일들을 그려보았다. 오전에 출근을 하면 메일을 확인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일들을 마주해보려고 한다. 나에게 도착한 의뢰 메일을 잘 읽고 그 일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에서 가장 집중을 요한다.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면 메일에 대한 답신은 오후로 미뤄진다. 긴 고민의 시간은 대체로 주어지지 않으므로 가능한 빠르게 답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진득이 고민을 할 수도 없다. 오늘은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나를 마냥 기다리고 있다.
그것들은 책 속에 들어갈 삽화의 스케치이기도 하고, 표지 그림의 시안 작업이기도 하고, 그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하는 자료 조사이기도 하다. 급한 원고 마감을 앞두고 글의 뼈대를 잡은 일이기도 하고, 퇴고를 몇 차례 거친 원고를 다시 지우고 고치는 일이기도 하다. 출간 계약을 마친 다음 단행본과 그다음 단행본의 목차를 정리하거나 원고를 쌓아가는 일도 매일 나를 기다리고 있다. 와중에 연재 청탁을 받으면 길게 보고 다져가야 하는 일들은 후순위로 미뤄진다. 추천사를 써야 하는 원고를 읽어야 하거나 글에 인용할 책을 읽어야 하기도 한다. 당장 동네 책방에 입고해야 하는 책과 제품들을 포장하거나 정리하는 일도 번번이 찾아오고, 근처 책방에서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 준비도 짬짬이 해둬야 한다. 그러니까 책의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일들을 매일 마주하면서 살고 있다. 그것도 나의 이야기를 드러내면서, 남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을.
받았던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조금은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내가 하는 일은 누군가에겐 얼마나 고요해 보이는지를.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나의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코 맹렬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일들이 그렇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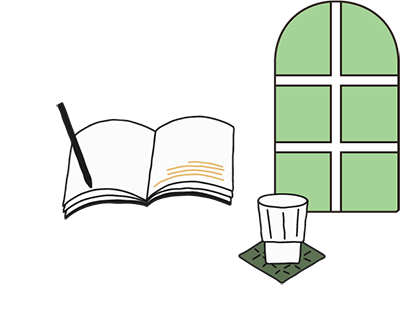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아침에 보내는 헌사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지칠 대로 지친 매일을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하루를 반복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얼까. 그건 적어도 나는 나의 과정을 알고 애쓴 마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책의 세상에서 지내며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일을 스스로 골라서 매번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은 나의 쓸모를 나에게 선사하는 일이고,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에 물을 주는 일이다.
세상을 화끈하게 변화시키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긁어모으는 일도 아니고, 게다가 책의 세상은 점점 좁아져만 가고 책을 읽는 사람 또한 줄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의 일을 계속해서 사랑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건 사랑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어렵게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종이로 새롭게 옮겨질 이야기를 그리고 쓰고 정리하는 일. 몰두하고 그려보고 머금어보고 표현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나의 테이블에 앉아 작고 밝은 등 하나를 켜는 순간. 이 순간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정할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매일 일하는 나를 만나고 싶다. 이십 대 초반부터 일을 해온 나는 삼십 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마주하고 싶은 나의 책상을 찾았다. 늦었다면 늦었고, 어쩌면 빠르게 찾은 건지 모른다.
작업실에 출근한 아침,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이 아침이 오늘도 주어졌다는 걸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일 테지만 좁은 작업실 안에서는 오늘의 힘을 짜내고 있는 나에게 감사하고 싶다. 단조로워 보일지라도 계속 해내고 있는 나에게 말이다. 골몰할 것을 찾아 떠나는 조용하고 느린 나라는 모험가가 바쁘게 움직이는 걸 보면 뭐든 끝까지 해보고 싶다. 스스로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슬며시 찾아온다.
그저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단순히 말하기에는 마음이 조금 복잡하다. 계속해서 나만의 책상이 필요한 하루를 꾸려가고 싶다. 노란 조명 아래에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마주하며 고개를 숙이고 싶다. 좋은 이야기를 만들고 좋아하는 이들에게 선사하고 싶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나를 계속 만나고 싶다. 작업실에 이 말풍선들을 크게 그려두고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