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과 꿈 사이, 나를 찾는 여정
부모님의 재능을 대물림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던데, 아쉽게도 내게는 그런 행운이 주어지지 않았다. 두 분 다 직업상 이과 계열 과목에 능통했는데, 내 수학 성적은 언제나 바닥을 헤맸다. 물리나 지구과학 같은 과목은 아예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나마 조금 흥미를 느낀 건 영어였다. 외국어에 소질이 있다고 느낀 건 중학교 3학년 때였다. 영어 성적은 썩 좋지 않았지만, 외국에 대한 동경으로 사전을 뒤져가며 열심히 해외 펜팔을 했다.
1년쯤 지나자 펜팔 친구는 세 명으로 늘었고 영문 편지를 쓰는 일은 점점 쉬워졌다. 대학에서는 일본어를 전공했다. 영어에 대한 나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었다. 대학 입학 후 영화 동아리에서 엉뚱하게 프랑스 영화와 샹송에 빠져 프랑스어를 공부하기도 했다. 당연하게도, 이런 내 꿈은 외국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우먼’이 되는 것이었다. 졸업과 동시에 찾아온 IMF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외국계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제 꿈을 이루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라는 말
하지만 막상 어렵게 들어간 회사 업무는 적성에 맞지 않았다. 석유화학부에 배치된 나는 매일 벤젠, 톨루엔, 에틸렌 같은 화학 원료들을 놓고 가연성인지 휘발성인지, 굴절률은 얼마이고, 거래량은 몇 톤인지 등을 문서로 작성해 해외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야 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우먼’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갔고, 내가 만든 종이문서나 전자문서들만이 나 대신 열심히 해외를 누볐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구독하던 신문의 공고란에 모 영화잡지의 기자 모집 공고가 실렸다. ‘외국어 능통자, 해외 출장 가능자 우대.’ 그 한 줄에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느낌이 들었다. 집에 가 부모님께 상의하자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구나”하는 냉담한 반응이 돌아왔다. 친구들도, 친하게 지내던 회사 선배도 마찬가지였다.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해. 돈을 벌려면 따분해도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맞아.” 열흘을 끙끙 앓다 마감을 하루 남기고 잡지사에 지원서를 넣었다. 기자가 되겠다는 열망이 강해서라기보다 새로운 도전 앞에 겁부터 집어먹은 내가 싫어서였다. 한 걸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사람들만 넘쳐날 뿐. 그렇게 난 잡지사의 기자가 되었다.
연봉은 반토막이 났지만 일은 두 배로 재미있었다. 신나서 출근하고 열정적으로 야근하는 나를 보며 부모님은 한숨을 쉬었지만, 이제야 꼭 맞는 맞춤복을 입은 것 같은 나는 하루하루가 편안하고 행복했다.
가지 않은 길을 향해
몇 년쯤 잡지사를 다니던 어느 날, 문득 물음표가 그려졌다. ‘내 꿈이 편집장 데스크에 앉는 것이었나?’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보다는 홀로서기를 하고 싶었다. 집에서는 “이제 그 박봉조차도 못 버는 거냐”며 난리가 났다. 이번에는 한 달을 끙끙 앓았다. 겨우 쌓아온 커리어마저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커다란 산으로 다가왔다. 그걸 넘을 용기를 준 건 오래전 읽었던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이었다. 가지 않은 길을 가기로 했고, 모든 게 달라졌노라는 마지막 구절은 언제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게 만든다. 그렇게 나는 프리랜서 작가의 길을 택했다. 덕분에 지금은 해외 출장도 다니고, 편집장도 하고, 짐 로저스나 톰 크루즈 같은 해외의 명사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영어로 편지(이메일)도 쓴다. 원하는 길과 가장 멀어 보였던 길이, 오히려 더 가까운 길이었다는 건 정말이지 아이러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전인미답의 길을 과감히 택할 것인가는 오롯이 자신의 선택이다. 박봉이나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만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한 나 자신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미 걸어온 길과 아직 가지 않은 길 사이에서 기꺼이 세상의 톱니바퀴 속으로 다시 맞물려 들어갈 채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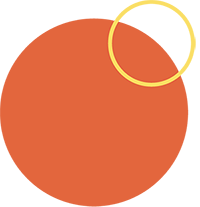
여행지 〈KALPAK CLASS〉의 편집장이면서 광고 카피를 쓰는 프리랜서 카피라이터이자 칼럼니스트. 무늬만 ‘4개 국어 능통자’로, 기억 총량의 법칙에 따라 한때 유창했던 외국어를 점점 잊어가고 있다. 작가로서보다 ‘초코’라는 장난꾸러기 시츄와 수족관 속 ‘니모들’의 엄마로 사는데 크나큰 행복감을 느끼며, 공동 저서로 〈365 여행: 여행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