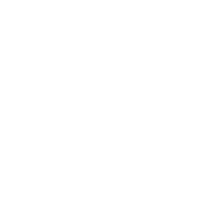

너무 애쓰지 마라, 모든 것이 지나간다
지난겨울을 태국에서 보냈다. 딸이 카이트서핑을
하는데 동무해 주러 간 것이라 본격적인 여행은
아니지만 그게 어디랴. 우리는 장장 80일간 태국
중부의 후아힌에서 지냈다. 국내의 혹한과 폭설
소식이 들릴 때마다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에 뭐라도
하나 성과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후아힌은 해변도시인 데다 바람이 잘 불어서
30도의 날씨인데도 마냥
쾌적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나는 상태가 좋지 않았다.
요양원에 계신 엄마의 영향이 컸다. 평생을 쓸고
닦고, 밥 해 먹이고, 자식들 키운 것으로도 모자라 손자들까지 봐주고, 집을 물려주었는데도 요양원
신세라니. 자식들에게 저마다 이유가 있었지만
그건 명백한 ‘유기’였다. 엄마를 ‘버리고 나니’
산다는 게 거대한 농담 같았다.
거기에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실제로 2배속으로 느껴져 당혹스러울 때 나는 자주 멍해지곤 했다. 매사에 시큰둥하고 재미가 없어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떡하나 겁이 날 정도였다.
그러다가 여행지에서 어떻게 바뀌었더라? 여행을 가면 모든 것이 낯설어서 바짝 긴장을 해야 한다. 지리를 모르니 겨우 지하철 타는 일도 큰 모험이 되고, 언어가 다르니 작은 소통에도 기분이 날아간다. 거주공간이 달라지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서, 우리는 월 40만 원짜리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방에서 바다가 보였다. 바다는 매 순간 좋았다. 벌겋게 금빛으로 빛나는 아침과 은색 비단처럼 차분한 오전과 하얀 파도가 짐승처럼 포효하는 순간 모두 바라보기만 해도 좋았다. 그 바다에 알록달록한 연이 수십 개 뜨면 그야말로 ‘퐌타스틱’했다. 실제로는 빠른 속도일 텐데 멀리서 보니 꿈결처럼 나부끼는 연이 “너무 애쓰지 마라. 모든 것이 지나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몽환적이었다. 거기 딸의 연이 등장하면 더욱더 지금 내가 누리는 호사가 믿기지 않았다. 노란색 연이 많지만 폭과 무늬가 달라서 딸의 연을 알아볼 수 있었다. “12시 반, 방금 네 연이 지나갔어.” 문자를 보내는 손길이 연인처럼 정다웠다.
일 상에도 소풍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살인적인 물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전에 유럽여행도 길게 해 보았지만 우리 모녀의 최종선택은 동남아다. 가깝고 물가가 싼 것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는가? 물가가 싸다는 것은 밥벌이에 매이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면에서 자유와 동의어이다. 우리는 현지인식당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태국의 식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 이동을 많이 하지 않고 한 군데 체류한 덕도 있지만 한 달에 인당 백만 원 정도로 생활할 수 있었다.
코끼리 같은 태국 전통무늬를 넣은 원피스와 통 넓은 바지도 만 원이면 훌륭해서, 마음에 들면 편한 옷, 여성스러운 옷, 실험적인 옷을 모조리 사기도 했으니 일상이 소풍이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태국옷을 입고 후아힌 해변을 걷는 모습은 묘하게 감동을 주었다. 여행자 중에는 나이 든 사람도 우리보다 훨씬 개방적인 옷차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령과 스타일과 국적 같은 경계가 사라진다. 다문화에 성큼 다가가며 사고와 포용력이 확장되니 젊어지는 듯한 기분이 다 든다.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지자 오래 끌어안고 있던 원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태국을 떠나기 전에 출판사에 보낸 원고가 〈엄마와 딸 여행이 필요할 때〉라는 책이 되어 막 나왔다. 여행은 일상에 대한 호기심을 되살려주어 활기를 되찾게 한다. 대화거리도 늘어나서 딸과 나는 여행지에서 제일 사이가 좋다. 여행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전부가 아님을 극적으로 알려준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해 주어 나도 몰랐던 나를 끄집어 내준다. 즉 나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준다. 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신분 중에 여행자가 제일 좋다.